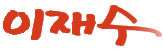손님들도 책이야기에 한하여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책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는 자유게시판(손님방)으로...
해가 기우는가 싶으면 소슬바람이 일었다. 가을이 달음박질쳐 오고 있었다.
감골댁은 지친 걸음으로 사립문을 들어섰다. 머릿수건이며 삼베적삼에 먼지가 부옇게 앉아 있었다. 하루종일 품팔이 밭일을 한 흔적이었다.
집 안에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스산한 바람결에 나뭇잎 몇 개가 토방 아래 구르고 있는 집 안은 썰렁하기만 했다. 좁장한 마루를 가운데 두고 방 둘에 부엌 하나가 딸린 그 흔한 초가삼간은 짙은 회색빛 지붕을 인채 외롭게 가을 추위를 타고 있었다./아리랑 5권 189쪽
“이눔아, 누가 니보고 농사지라고 혔어! 니눔이 빨갱이법에 정신이 홀까닥혀서 내 논 공짜로 묵어칠라고 니눔 좋아서 진 종사제. 허고, 빨갱이눔덜이 달근마시허는 말에 잠시잠깐 고런 느자구웂고 호로시런 맘 묵었드라도 다시 대한민국을 시상이 달라졌으먼 회개허고 그 못된 맘얼 고쳐묵는 것이 아니라 뎁되 반타작얼 해도라고? 고러 맘뽀가 무신 맘뽄지 아냐! 바로바로 빨갱이맘뽄 것이여! 니눔언 영축웂이 빨갱이여, 빨갱이!”
이렇게 소리친 것도 모자라 지주는 그 사람을 경찰서에 고발했다는 것이었다./태백산맥 264쪽
난생처음 현관으로 들어선 전태일은 자신의 몰골이 더 초라해지고 주눅이 드는 것을 느꼈다. 시청 현관은 뜻밖에도 넓은데다가, 바닥에 깔린 대리석들은 그 특유의 윤기를 내며 반들거렸고, 천장은 으리으리하게 높았다. 열서너 살 때부터 신문팔이, 구두닦이, 껌팔이 같은 것을 하면서 수없이 보아온 시청의 칙칙한 겉모습에 비해 속모습은 전혀 딴판이었다.
전태일은 숨을 한껏 들이켜 어깨를 펴며 서류봉투 든 손아귀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실로 걸음을 떼어놓기 시작했다.
“근로감독관이십니까?” /한강 149쪽
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에 등장했던 수많은 인물들. 그들이 뱉어낸 생각들을 다시 꺼내 보았다. 소설 속의 인물들이 지금도 책 속에서 여전히 꿈틀거리며 세상과 부딪히며 살고 있었다. 익숙한 이름인가 했더니, “아! 무당딸 소화를 건드렸던 놈!”이라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하룻밤 여섯 번의 정사를 치룬 최대치가 부럽다고 할 정도로 시기를 했던 기억들, 지주들과 소작농들의 신경전 속에서 결말을 지켜보던 기억들, 전태일이 자본에 항거하며 투쟁하던 모습의 아타까운 사연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들을 다시 정리할 수 있을까.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을 또 시작했다는 바보스런 생각들이 가득차고, 책표지를 바라볼 때마다 책 속의 주인공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그들의 생각을 잊고 지냈다.
소설 속 인물들은 제 각각 주어진 역할에서 시대를 대변하거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예지력 있는 사람들이었다.
소설가가 낳은 인물들이었지만, 그들이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
80년대 말 대학생들의 필독서였던 ‘태백산맥’. 작가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공권력에 탄압받으면서 쓰여졌던 ‘아리랑’, 뒤 이어 현대정치와 시대적인 민초의 삶을 그린 ‘한강’. 이 세 편의 소설이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는 사실.
작가의 희생과 집념이 대중들의 생각과 삶의 변화를 깨우친 결과를 가져왔으니, 아직도 이 책의 저자에게 존경심이 없다면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서 가장 악한 역할의 주변인물이나 다름 없는 셈이다./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