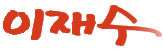미술평론/보도자료
2007. 10.
우려를 지우고 그가 돌아왔다
글/ 시인 김기연
이재수를 만난 곳은 소리 없는 싸움터였다. 세상의 수많은 구경 중에 가장 재밌는 것이 싸움구경이라 하였던가. 그는 즐겁게 싸우고 있었다. 아니 구경꾼을 즐겁게 만들었다고 해야만 더 정확한 것일지도 모른다. 자판을 두드리며, 모니터를 응시하며 불의와 단판을 내는 것이었다. 밀었다간 당기고, 당겼다간 밀어내면서. 아, 그러다가 싸움의 불씨는 내게로 번졌다. 아니 내가 먼저 불씨를 던졌음이지. 그와 나는 잠을 파먹으면서 싸움을 북돋우었는데, 그가 갑자기 패를 던져버렸다. 싱거워졌다. 그러니까 2000년 봄, 어느 덧 여덟 번의 봄이 오고 간 결코 짧지 않는 세월의 옛 일이다.
그는 가슴에 대숲을 담고 사는 적막한 사람이다. ‘적당히’가 용납 되지 않는 사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타협이 있을 수 없는 사람, 현실에 손 내밀지 않으니 ‘왕따’인 사람이 그다. 생각건대 이재수는 천 상 작가다. 그런 외고집쟁이가 작가가 아니었더라면, 무서운 그 적막 무엇으로 채울 수 있었겠는가.
나는 그의 여백을 좋아한다. 감상자로 하여금 생각할 시간을 배려하기라도 한 듯 비어 있는 그 공간은 차라리 풍요롭다. 구름이 비를 몰고 오듯 그의 작품은 생각을 끌고 오는 힘이 있다. 그런 그가 수년간 작품과 거리를 둔 듯하여 안타까웠다. 넌지시 걱정이 앞섰다.
우려를 지우면서 그가 돌아왔다. 이백여장의 천위에 상념을 풀어내었다. 야트막한 산 하나를 거뜬히 안았다. 깃발이 되어, 성이 되어, 하늘이 되어, 구름이 되어, 감상자의 풍경이 되어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