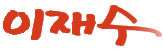미술과 소통 - 시각문화 - 잡동사니
화가들이 화선지를 곱게 접어 조심스럽게 들고 가는 곳이 있다. 화랑가나 화가들 왕래가 많은 골목에 몰려 있는 표구사다. 표구사의 분위기는 어느 곳이나 비슷하다. 출입구 옆 담벼락이나 유리창에는 큰 화판이 세워져 있다. 그 위에 배접을 마친 그림을 붙여 놓고 말린다. 표구사 안은 오려지고 찢겨나간 종이나 비단 쪼가리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다. 벽면에는 표구를 마친 작품 몇 점이 걸려 있다.
표구사 주인은 언제나 양복을 입은 채 앞치마를 두르고 있다. 넓은 탁자 앞에 허리 숙여 종이를 자른다. 종이 자르는 기술은 무술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무예나 다름없다. 길게 자를 때는 자를 대고 그어대지만 짧게 자를 때는 자도 대지 않고 솜씨를 낸다. 작가들은 표구기술자가 표구하기 위해 작품에 칼을 댈 때 조마조마해서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표구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실수가 있게 마련이다. 작가가 보는 앞에서 행여 작품이 찢기거나 구멍이 난다면 그 고통이 작가 가슴팍까지 전달되어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다. 화선지는 재질이 부드러워 신중하게 칼질을 해도 깔끔하게 오려지지가 않는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표구사에서 비웃음거리다. 표구사에서 작품을 찢어 먹거나 표구를 망치는 일은 극히 드물다.
표구사에 들어서면 께끄름하고 구릿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배접할 때 쓰는 밀가루풀 냄새다. 화선지에 그린 그림을 표구할 때는 부러 삭힌 풀을 사용한다. 오래 삭힌 풀일수록 붙인 종이나 비단이 나중에 오므라들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다. 과거에 표구기술자들은 풀을 최소한 1년 이상 삭혀서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우리나라 기후가 계절마다 달라 사계절동안 삭혀야 기후변화에 적응이 잘된다고 한다.
표구사는 미술관이나 화랑에서 가지런하게 전시되어 있는 작품을 감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감상자의 시각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묘안을 짜내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값진 작품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감상자 앞에 나오는지 살펴보면 흥미롭다.
낙관을 마친 작품이 감상자 앞에 나서기 전에 최종적인 검증(?)절차를 밟는 곳이다. 작가들의 애환이 서려 있기도 하다. 왠만한 표구사에는 작가들의 사정으로 인해 찾아가지 못한 작품들이 쌓여 있다. 제 각기 사연이 있는 그림들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면, 표구사 주인과 함께 웃다가 울다가 나자빠지는 경우도 있다./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