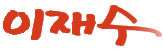미술과 소통 - 시각문화 - 잡동사니
<이어서...>
가끔 자동차 지나는 소리가 들려올 뿐 사람들이 많은 동네 같지는 않았다. 종일 아무 것도 먹지 못했다. 주인이 나를 묶어놓고 마른짚과 씀바귀 몇 포기를 던져 놓고 갔지만, 이곳까지 오는데 인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로 이동하여 멀미가 올라왔다.

익숙지 않은 환경이었다. 더욱 궁금한 것은 나를 데려온 새 주인의 성격이었다. 염소를 키워본 적이 있는 사람인지, 염소 식성들은 잘 알고 있는지 파악할 길이 없었다. 사육장에서는 옛주인이 던져 주는 건초 따위만 먹고 놀았는데, 새 주인은 어떻게 나를 상대할 지 불안하고 초초한 시간들이었다.
주인의 성격을 알아야만 했다. 이곳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도 알 수 없었지만, 향한리에서 살 때 동생이 옆동네로 팔려가기 전에 엄마가 동생에게 "새 주인과 기싸움 해서 이겨야 편하다"라고 조언해 주던 기억이 났다.
주인의 반응을 보기 위해 마른짚과 씀바귀가 담겨져 있는 바구니를 멀리 걷어찼다. 아니 기싸움을 하고 싶었다. 나도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성질이 고약하다고 건너편 우리에 살던 흰염소 가족에게까지 소문났던 터였다.
주인이 내가 걷어 찬 바구니를 다시 뒤집어 놓고 그곳에 다시 마른짚과 씀바귀를 넣어 두면 내가 기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가 저물 무렵 오후에 타고 왔던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주인이었다. 주인은 내게 슬쩍 눈길을 주는가 싶더니, 엎어져 있는 바구니를 보고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구석에서 주인을 노려보며 행동을 관찰했다.
자동차만 주차장에 놓고 다시 밖에 나간 주인은 밤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졸음이 몰려왔지만 잠자리가 바뀌어서 도무지 잠을 청할 수 없었다. 나를 데려다 놓고 첫날부터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 참으로 이상한 주인이다./숲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