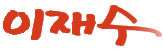미술과 소통 - 시각문화 - 잡동사니
 지난 가을 동네 야산에서 따온 모과 두 개가 작업실 한 켠에 자리 잡고 있다. 못생긴 녀석이라도 빛깔이나 향은 제법 쓸만하여 조각작품을 받치고 있던 나무 탁자 위에 전시(?)했다.
지난 가을 동네 야산에서 따온 모과 두 개가 작업실 한 켠에 자리 잡고 있다. 못생긴 녀석이라도 빛깔이나 향은 제법 쓸만하여 조각작품을 받치고 있던 나무 탁자 위에 전시(?)했다.
값비싼 조각작품을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모과의 시각적인 끌림 현상은 메마른 소품들고 가득 찬 작업실 전체의 분위기에서 주요한 소품으로 당당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처음 모과를 따왔을 때의 빛깔은 푸르스름한 끼를 벗지 못할 때였다. 한 달이 지나면서 노랗게 변해 갔고 몸을 말리면서 내는 향은 마른 냄새들을 모두 잡아 먹었다.
모과 두 개에서 나오는 향은 1년 내내 사용하던 사무실용 살균방향제 퀸스향을 압도했다. 작업실에 들어서면 처음 코끝을 간지럽히는 모과향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하루 한 번 만졌더니 손에는 늘 모과향이 묻어 있었다.
청소를 하면서 모과의 자리를 옮기려는데 벌써 이 녀석이 자신의 몸을 검붉게 태우면서 끝까지 향의 강도를 맞추고 있었다. 노란빛에서 검불게 타 들어가는 모습도 시각적인 즐거움의 하나였다.
학생 때 정물화를 그리려면 반드시 정물대에 몇 개 놓 여져 있었는데, 선생님은 우리에게 모과의 빛을 검붉게 마무리할 것을 강조했었다. 그 때는 모과가 노란색인데 왜 자꾸 검붉은 물감으로 마무리 하라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선생님은 인생경험에서 나온 예지력으로 모과의 끝말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고, 그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다.
못생긴 모과가 옛 스승님께 새해 인사하라고 재촉한다. 다시 한 번 모과의 끝말을 그려보며 늙은 스승님께 새해 인사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