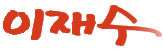미술과 소통 - 시각문화 - 잡동사니

장마가 주말을 덮었다. 밤새 내리던 비가 새벽에 멎는가 싶더니, 아침부터 땡땡 쬐는 여름햇볕이 들었다.
등산로 입구부터 습한 기운이 올라오고 숨이 헉헉거릴 정도로 후덥지근했다. 날마다 산을 타는 사람처럼 몸이 만들어진 상태는 아니었다. 낮은 야산이라고 하지만, 등산경험이 많지 않은 체력으로는 꽤 힘든 산행이다.
산은 장마에 물먹은 나뭇잎들이 대신하여 뛰엄뛰엄 올라오는 등산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걸음이 무거웠다. 딛는 걸음마다 왜 이곳에 오르고 있는지 특정한 목표가 없었다. 산행을 즐기는 편도 산에서 어떠한 영감을 얻어오는 일도 없었다. 그저 집 가까운 곳에 등산로 입구가 있고 등산로 입구에 약수터가 있어 산책을 겸한 산행이었다.
등산로 입구부터 산이 가파르게 느껴졌다. 숲이 하늘을 가려 해는 보이지 않았다. 사람이 산을 타는 것이 아니라 숲이 사람을 빨아드리고 있었다. 등산로 입구로 하나 둘씩 모여들면서 같은 곳을 향해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한지 10분도 되지 않아 허벅지와 장단지의 근육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다. 등산로 입구가 가장 가파르지만, 높은 곳을 오르는 힘도 부족하고 숨을 헐떡거리는 체력이 못내 부끄러웠다. 송송 흘러내리는 이마의 땀은 누가 볼까 두려워 내심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시선을 아래에 두고 올랐다.
왼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어떠한 대상을 촬영하거나 기념사진을 찍기 위한 소품은 아니었다. 집에서 몇 걸음되지 않는 등산로 입구까지 승용차를 타고 왔다. 카메라를 승용차에 놓으면 도둑맞을 까봐 차에서 꺼내온 장비였다. 카메라를 차량에 두었다가 여러 번 도둑을 맞은 기억이 있었다.
산을 오르는 사람이나 등산로 주변을 촬영하면서 올랐다. 기이한 나무가 있으면 화면에 담고 오르고 있는 길도 찍었다. 등산로를 따라 주변을 둘러보면 구도를 잡을 필요도 없이 울창한 숲의 그림이 이어졌다. 평온한 숲 속에서도 풍파가 있었는지 배배꼬며 올라간 소나무들도 보이고, 장마에 굶은 다람쥐나 청솔모도 고개를 내밀었다.
뒤늦게 산에 오른 등산객들보다 훨씬 뒤처졌다. 정상을 오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일요일 오전 숲의 기운이나 얻어오겠다는 속셈이었다. 산을 타는 걸음은 누가 보아도 억지로 오르는 것처럼 가볍지는 않았다. 게다가 산을 향한 경건한 마음이나 상쾌한 기분의 표정을 만들어내지도 못했다. 체력이 산을 타는 사람들의 평균 체력에 미치지 못한 탓이었다.
뒤를 이어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앞서 갈 것을 주문이라도 하듯, 걸음을 더 늦게 뗐다. 주변 산세를 감상하는 척 하면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의미 없는 시선을 숲 속에 두기도 했다. 아무런 이상이 없는 카메라를 살펴보는 척 하기도 했다. 뒤를 따르던 남자 한 명이 옆을 스쳐 올라갔다. 앞질러간 남자는 소나무 뿌리가 계단처럼 보이는 턱을 거뜬히 걸음했다. 앞질러간 사람과의 거리는 순식간에 멀어졌고, 또 다시 뒤이어 올라오는 사람들이 옆을 또 스치고 올라가는 일이 반복되었다.
늦은 걸음으로 산을 오르고 있었지만,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다. 뒤춤에서 인기척이 있으면 뒤에서 오르는 사람이 있다는 정도를 느낄 수 있었다.
앞질러 오르는 사람들이 몇 명 교차하는 가 싶더니, 이번에는 멀리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보였다. 내려오는 사람들은 아마도 새벽에 산에 올랐을 것으로 짐작됐다. 정상까지는 두어 시간 걸리는데, 이른 새벽에 출발했다면 내려올 시간이었다.
내려오는 등산객을 몇 걸음 앞에 두고 있을 때였다. 뒤춤에서 금새 여인 한 명이 옆을 스치며 앞질러 올랐다.
눈 앞에서 내려오는 사람과 앞질러서 오르는 사람이 교차하고 있는 장면이 예상되었다. 감각적으로 카메라 렌즈 뚜껑을 떼어내고 외길에서 내려오는 사람과 올라가는 사람의 화면이 되도록 구도를 잡았다. 철컥 철컥. 숲속의 기계음이라서 그랬던지 앞질러 오르던 여인이 흠칫 뒤를 돌아봤다./숲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