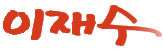미술과 소통 - 시각문화 - 잡동사니
15년 전. 모니터 안의 검은 도스창에서 깜빡거리는 네모난 프로프트 하나로 세상을 개벽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을 때다.
컴퓨터 전공도 아닌데 작업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어설픈 IT지식으로 프로그램 두 개를 개발하여 사용한 적이 있다.
변화하는 컴퓨터 사양에 맞게 업그레이드 하려고 일반인들에게 무료배포하여 많은 네티즌들이 사용을 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버전업 하지 못하였는데, 다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을 때에는 이미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 의미가 없어진 구버전되었다.
펜티엄1 환경에서 구동되던 프로그램이었지만, 아직도 당시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있다. 쉽게 말하면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을 잠깐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틀림없다.
사람들은 직접 제작한 컴퓨터 프로그램도 있을 정도라면서 내가 무슨 컴퓨터 박사인줄 알고 있다. 사실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다고 우쭐해 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10여년 전 각 대학에서 컴퓨터 관련학과가 많이 개설되었는데, 대학은 학생들에게 강의해야 할 컴퓨터 전공자들이 없었다. 순수미술을 전공한 내게는 컴퓨터 프로프램을 개발할 연구실적이 있었으니, 컴퓨터 관련 과목 강의배당은 당연했다.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은 IT기술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여 어릴 적부터 인터넷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시기가 되면, 학생들보다 가르치는 선생의 감각이 더 둔할 것이라는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다.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교육 받아본 적이 없는 딸 녀석보다도 모르는 것이 더 많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아직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거나 공과금 납부하는 일이 승용차 타고 은행까지 가는 일보다 더 번거롭고, 자료들을 보관할 때 파일로 보관하려 하지 않고 종이 위에 기록된 활자로 보관하려 한다.
이메일을 쓰면 편리한데 꼭 우표 붙인 편지를 보내야 마음이 놓이고, 사진을 찍으면 모니터에서 볼 수 있는데도 현상소에 가서 인화를 해서 봐야 사진처럼 보인다.
글을 써도 모니터 상에 떠 있는 글은 글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문헌들은 책에서 보는 것처럼 진실성이 없어 보이니... 늙은 정보통신맹이지.[이재수]